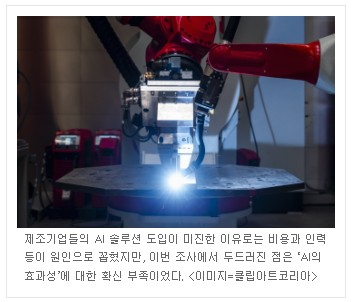
제조 대기업들의 AI 솔루션 도입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5%를 밑돌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펴낸 ‘K-성장 시리즈(7)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3%가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개인 단위의 생성형 AI 사용은 제외하고, 생산·물류·운영 등 AI 솔루션 도입·활용 여부를 물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AI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마저도 49.2%로 절반을 밑돌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4.2%에 불과했다.
제조기업들의 AI 솔루션 도입이 미진한 이유로는 비용과 인력 등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AI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 부족이었다. ‘AI 전환이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0.6%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바라봤다. 효과가 클 것이란 응답은 39.4%였다.
보고서는 OECD가 G7 및 브라질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AI의 도입·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투자 수익률 추정의 어려움’이 지목된 바 있다고 짚었다. 또 2024년 한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서도 국내기업 CEO의 57%가 ‘AI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AI 도입의 걸림돌로 꼽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도 없고, 충원도 안해…제조 AI 전환 난망
AI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73.6%는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대기업(57.1%)보다 중소기업(79.7%)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AI의 연료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에서도 응답기업의 절반(49.2%)은 ‘전문인력 채용 부담’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개인정보 이슈에 따른 규제 부담’(20.2%), ‘데이터 정제 부담’(16.3%), ‘데이터 수집 시설 부담’(14.3%)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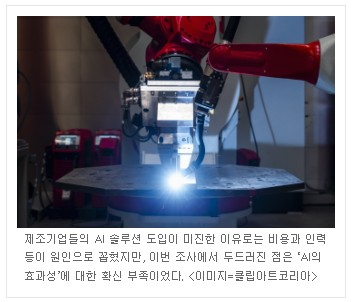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80.7%가 ‘없다’고 답했다. AI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82.1%가 충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기업(14.5%)이나 신규 채용한다는 기업(3.4%)은 17.9%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 수준으로 중국(41만1000명), 인도(19만5000명), 미국(12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라며, “절대적 숫자도 적은데 그나마 있는 인재조차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HAI 조사(2025)에 따르면, 한국은 AI 인재 순이동’이 –0.36으로 인재 순유출국에 해당한다.
대한상의는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에 단순히 자금 지원이나 장비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AI 도입 단계를 나눠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업종과 규모별로 적합한 AI 활용 모델을 진단·설계해 주는 컨설팅을, ▲도입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정제, 알고리즘 적용 등 실무 중심의 기술 지원을, ▲도입 후 단계에서는 기업 내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AI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및 현장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
또한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는 구독형 서비스(SaaS) 기반의 AI 도입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제조기업들이 AI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증 모범사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AI 활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64.1%가 ‘생산 효율화’를 꼽았다. 제조업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제조 AI 모델 공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산업부가 제조AX 얼라이언스를 통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기부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AI센터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돼 있는 곳을 활용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AI 전환의 효과성을 체감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 등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모델 공장, 솔루션 보급 등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강력한 지원,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담은 선택과 집중의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